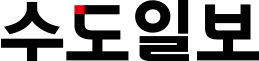최지인
발을 헛디뎠는지는 모르지만
징검다리를 건너다
그녀가 내게로 무너졌을 때
차가운 물에
내 발목 적시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 살풋 들여다보이던
그녀의 눈부신 속살이
오늘 온 산에
아찔한 향기로 덮였습니다
속수무책
봄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겪는 봄은 몇 번이나 될까. 각각 다르겠지만 대략 70번쯤 될 것이다. 한데 언제나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 무엇인가는 변화가 있어 느낌으로 감지하지만 맞이할 때마다 봄은 똑같다. 그러나 맞이할수록 봄의 느낌은 다르다. 연륜으로 쌓은 삶이 다르게 인식하고 새로운 감정을 드러낸다. 사람의 삶은 그래서 변화무쌍하고 짧지만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생에서 봄이 주는 역할은 한 해의 전부를 미리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며 바라는 것에 기대감을 한층 높인다. 그러한 이유로 겪어보지 않았지만 언젠가 겪어본 듯 느낌으로 환상에 젖게 하는 것이 봄이다. 모든 시인이 봄노래를 불러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고 시인이 아니라도 봄노래는 한번쯤 불러 보는 게 사람이다. 그러나 최지인 시인은 남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노래를 부른다. 해마다 맞이하는 봄이 변화 없이 흩어진 게 아니라 한 층 한 층 쌓인 황홀한 꽃탑으로 다가와 그만큼의 크기로 서 있게 한다.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온 봄을 어쩌란 말인가. 차가운 물속에 발을 적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위험이 닥쳐오는 것도 모르게 봄은 우리 곁에 이미 와 버렸다. -이오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