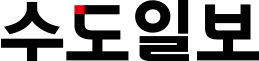허형만
시에도 벼랑이 있어
한 발이라도 헛디디거나
사유의 깊이에 잘못 들면
수만 리 심연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나의 시는 늘 아슬아슬하다
땅과 가까이 피어있는 꽃이나
가장 먼 우듬지쯤 피어있는 꽃이나
땅을 향해 투신할 때의 심정은 똑같이
불안과 초조와 긴장감으로 전율하리라
나의 시도 꽃과 다르지 않아
봉오리로 맺힐 때부터
시 속의 흐르는 피의 성분은 이미
불꽃처럼 들끓다가도
정작 식으면 재로 남음을 아느니
벼랑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시의 간절함을 나는 안다
발밑에 수만 리 벼랑이 있음도 잘 안다
그래서 나의 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낙화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한다
시가 언어의 꽃이라면 자연적으로 피는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피는가. 자연적이라면 언어의 틀을 벗어나 아무 곳에서나 난무할 것이고 인위적으로 피어난다면 한정된 곳에서만 피는 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가 사람 간의 약속으로 발생한 무형의 몸짓이라고 한다면 언어는 어떻게 설명해도 자연적이 아닌 인위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는 인위적인 꽃으로 한정된 곳에서만 피어나고 한정된 사람이 피워낸다. 그러하므로 시는 각자의 몫에 따라 유무형의 틀에서 모양과 향기가 전부 다르다. 이것을 대하는 독자는 시인의 성향과 조각 솜씨에 각자의 감정을 시인의 감정에 맞춰 공감하든가 외면하는 부류로 나눠 작품의 높낮이를 판단한다. 그 결과에 따라 시인의 품격이 결정되므로 시인의 시 쓰기는 불안과 초조와 긴장감이 연속으로 일어나 한 편의 시를 쓸 때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된다. 그렇다고 시 쓰기를 멈추는가. 아니다. 오히려 긴장감의 희열에 점점 빠져들어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고 높은 벼랑을 찾는다. 이것이 시인의 숙명이다. 허형만 시인은 50년 전부터 시의 벼랑에 서서 맞은편 벼랑을 바라보며 이쪽과 저쪽에 외줄을 걸어놓으려는 고행을 멈추지 않는 원로 시인이다. 한 발이라도 헛디디거나 사유의 깊이에 잘못 들면 수만 리 심연에 떨어지고 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꾸준하게 맞이하며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왔다. 언어 이전의 언어를 찾아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불꽃처럼 요동치는 언어의 꽃을 피우려는 생을 보낸 것이다. 그 길의 험난함은 겉으로는 아무도 모른다. 함께 시를 쓰는 시인이라 할지라도 절대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의 벼랑에 서 있다는 것은 시인은 물론 독자들도 알게 되었다. 언어의 꽃을 피우기란 이처럼 험난하고 아슬아슬 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오장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