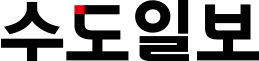맹기호
너는 몇 년을 망설이다
50년 동안이나 뽀얀 속살을 내어주던
아버지가 마당에 심은 살구나무를 베었다
너의 아들은 태어나던 날 심은
30년 넘은 적송도 베었다
키 작은 관목 몇 그루만 남겼다
새가 보이고
하늘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밤이면 별도 왔다
방문하는 손님들도
들어오며 환하다
마당을 비우니
세상이 마당으로 들어온다
너를 비우면
세상이 네 안으로 들어올까
바람을 보자. 어디든지 빈 곳을 찾아간다. 비우지 않았다면 바람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많이 비우면 태풍이 되고 너무 적으면 부채바람만도 못하다. 적당하게 비워야 원하는 바람을 만난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은 없다. 자신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도 이름이 틀리고 터전이 틀리고 과정이 틀리다. 그러다가 끝맺음도 틀리다. 같은 종류의 나무, 같은 속에든 동물,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전부 틀리다. 자신만이 가진 진화과정을 거쳐 왔듯이 자신만이 갖는 독특한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다르게 살았기 때문이다. 일직이 인류의 조상은 자신만의 삶을 가지려고 투쟁하고 그것에 맞게 진화해 왔다. 발전을 거듭하다가 우주와 자신과의 이반된 형태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 종류가 다른 삶을 살면서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게 한 것이다. 그것은 변하여 없는 것이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느꼈다. 맹기호 시인도 비움의 철학을 알았다.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보호하던 살구나무가 마당을 차지하여 너무 비좁다. 아들이 태어난 날 기념으로 심은 적송도 버겁다. 새가 가려지고 하늘이 덮이고 바람이 막혀 저녁이면 별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과감하게 베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삶은 그런 것이다. 유물이라고 기념이라고 채우기만 한다면 스스로가 갇혀 자연을 버려야 한다. 알고 나면 시원한 것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 한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있다. 삶의 터전을 가두던 것들을 베어냈듯이 너를 비우면 세상이 들어올까. 맹기호 시인은 여기에 더 중점을 둔 것 같다. 이 한마디를 하려고 나무를 베었고 하늘과 소통한 것이다.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낀 게 아니라 네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다는 고백이다. -이오장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