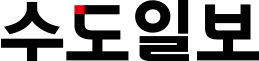김석심
침묵하는 바위 아래
유유히 흐르는 세월은
갇혀 버렸다
넓은 세상
많은 사랑 중
외로이 스스로
만든 침묵
암울한 노랫말처럼
지나간 회상들이
잔잔히 흐른다
리듬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많은 사람 속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은 전부를 안다는 것이다. 전부를 몰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다. 말을 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으로 바른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고 한 말은 무조건 입을 닫으라는 뜻이 아닌 좋은 말을 하기 위하여 먼저 들으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사색의 정신이 필요하다. 듣기만 한다면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귀에 들어온 것은 내면 깊숙이 묻어두고 깊이 헤아려 생각하는 정신적 기지가 필요하다. 그 자리 즉석에서 대답을 찾기도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시간을 두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부처는 수십 년을 사방팔방을 떠돌며 희로애락의 해답을 찾아내었고 예수는 몸소 실천하며 적재적소에서 인간의 사랑 방법을 찾아냈다.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은 이것이다’는 즉답도 있었고 인물과 사물의 대비와 하늘과 땅의 간극에서 답을 찾아 설파한 것이다. 인간사에서 침묵과 사색은 가장 중요한 철학의 기본이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칸트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등 많은 철학자는 인간이 어떠한 정신으로 삶을 개척해야 인간답게 사는지를 가리킨 것이다. 김석심 시인은 사색의 가장 기본심리인 자기와의 갈등에서 출발한다. 넓은 세상 많은 사람 중 외로이 스스로 침묵을 세우고 지난날의 회상에 젖어 살아온 날들의 옳고 그름을 재어본다. 바위처럼 말이 없어도 유유히 흐르는 세월 속에 갇혀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후회하지는 않는다. 인간을 구원하는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흐름의 리듬을 알았다. 그 속에서 노래 부르며 사는 삶이면 됐지 않은가. -이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