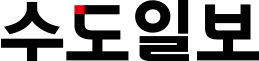대도시가 아니면 봄여름가을 어디서나 풀벌레 새소리, 졸졸 흐르는 개울 물소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산간벽지가 아니면 그 소리 들을 수가 없다. 기억마저 희미하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파릇파릇한 풀잎 그리고 나뭇잎 싱그러운 숲 그 속에 파묻혀 있을 땐 가슴이 뻥 뚫렸다. 그리고 마음이 두둥실 하늘을 떠돌았다.
졸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있노라면 금세 시려 올랐다. 거머리에 물려 피를 빼앗기고 모기 때문에 잠자는 것을 잃었다. 반딧불이를 쫓아 들판을 누볐다. 반세기 전 그러니까? 1960년대 이 땅에서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엔 그랬다.
18세기 영국 런던 하늘에 검은 연기를 품은 불기둥이 쏟기 전 지구는 그랬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지구의 운명을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 산업화는, 우리 삶의 질을 바꿔버렸다.
산업화와 근대화로 물질의 양이 넘치고 질이 개선 된 반면 환경적인 삶의 질은 악화됐다. 공해에 시달려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시름시름 목숨을 잃어갔다.
도심의 땅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꽁꽁 봉해버려 숨 쉴 틈이 없어졌다. 땅이라 해보아야 공기가 통하지 못하고 햇볕이 들지 않고 물기가 없으니 그 속엔 땅강아지 한 마리, 지렁이 하나 살지 못하는 곳으로 허해졌다.
회색 콘크리트 또는 붉은 벽돌로 건축한 건물로 둘러싸인 도시 공간은 상막하다 못해 흉물스럽다. 풀벌레 새소리가 아닌 이국 멀리서 이민 온 꽃매미 떼들이 나뭇가지마다에 다닥다닥 붙어 경연대회를 열었는지, 새로 펼쳐지는 세상을 호령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변해 버린 환경이 맞지 않아 터트린 울음소리인지, 시끄럽게 해댄다.
공해에 강하다는 도심 은행나무도 달리는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로 아직은 초록으로 싱싱해야 할 여름인데도 잎이 누렇게 알록달록 반점으로 치장을 하고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그 모습이 숲이 사라져 버린 도심의 풍경이다.
숲! 숲은 육지 생물종의 80%를 품어 보살피고 있다. 땅은 식물을 잉태하고 낳아 기른다. 사람들은 그런 숲으로 풀로 뒤덮인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 손길 발길이 뜸한 산골을 찾아 먼 길을 떠난다. 이름 모를 한가한 산골을 찾는다.
한적한 산골의 상쾌한 공기와 물은 자동차배출가스로 막힌 가슴을 뻥 뚫는다. 침침한 시야가 훤히 밝다. 맹맹한 코가, 실룩실룩한 눈, 지끈거린 머리는 씻은 듯 사라져 버린다. 맑은 공기는 살갗을 촉촉이 적신다. 깨끗한 물은 발길을 재촉한다. 쾌적한 환경의 진수를 맛본다. 인간이 바라는 삶의 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공해! 환경오염이 천변지이 따위로 말미암은 불행한 변고의 근원임을, 인류의 삶, 그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낭비를 막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프레온가스 폴리염화페비닐 유불화유황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줄여야한다.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막아야한다.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고 농약이나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을 막아야한다.
모를 한적한 산골이 아니래도, 도심 한 복판 높고 낮은 희끗희끗한 빌딩 숲이래도, 아스팔트며 콘크리트로 봉해버린 도심이래도, 여름이면 풀벌레 새소리가 귓전을 두들기고 개울 물소리 물방개 헤엄치는, 가제가 한가롭게 돌과 돌 사이를 드나드는 곳, 그런 환경으로 가꾸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인간의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