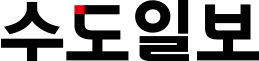완연한 늦가을이다. 비 온 뒤 그 모습은 애잔할 정도로 가슴에 들어차고 있다. 조그만 바람짓에도 나무들이 우수수 옷을 벗어 던지고 있다. 침잠 속으로 빠져드는 나무들에게 고맙단 인사를 한다. 산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사람에게는 시원한 그늘과 마음의 안식까지 주던 나무들이다.
추수를 끝낸 허허로운 논마다 ‘곤포볏짚사일리지’ 하얀 덩어리들이 들어차고 있다. 발음도 잘 안 되고 이상한 명칭에 쓴웃음마저 번져 나온다. 유년 시절, 추수가 끝난 논마다 볏가리들이 서 있어 놀이터가 되어주던 추억에 그 명칭은 더욱 곤혹스럽다. 고맙게도 산책 중인 가족의 아이 입에서 나온 명칭에 곤혹스러움이 상쇄된다. “아빠, 논마다 마시마로가 있어요.” 미소가 절로 나온다.
시골길을 걷다가 감나무가 있는 집이 보이면 절로 발길이 멈춰진다. 몸과 마음이 평온해진다. 감나무 우둠지에 남아있는 까치밥 때문이다. 집주인의 넉넉한 인심에 온몸이 질화로처럼 따스해진다.
우리 조상들의 삶은 가난했다. 초근목피에 보릿고개란 말이 유행했었다. 내 유년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가난을 채우기 위한 삶은 절박했다. 자연히 나눔의 삶은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동물들을 위해 까치밥을 남겨놓았던 조상들의 삶의 문화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동장군 겨울이 오면 까치밥 감나무로 직박구리, 동고비, 박새, 참새, 까치 등 온갖 새들이 날아올 것이다. 왜 하필 까치밥일까? 까치는 우리에게 친근하고 반가움을 전해준다는 속설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어려웠던 시절 내년에는 꼭 풍년 소식을 까치가 가져올 거라는 소원을 담아 까치밥이라 지었는지도 모른다.
까치밥 하면, 장편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 벅’이 떠오른다. 그의 한국 사랑은 유별나다. 그가 1960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이다. 소에게 짐을 싣고 농부도 지게에 나뭇단을 얹고 가는 모습을 신기하게 본 펄 벅, 힘든 삶을 서로 나눈다는 이야기에 그는 감탄을 연발했다. 또한, 겨울철 감나무 우둠지에 남아있는 감을 신기하게 보는 펄 벅에 까치밥의 의미를 설명하자 펄 벅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
“내가 한국에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그의 소설 ‘살아있는 갈대’에 ‘한국은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라는 예찬의 글이 나온다. 그의 유서에는 ‘내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미국이며, 다음으로 사랑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쓰여 있을 정도였다.
까치밥,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하나에까지 배려하는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다. 생명 존중의 사상이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각박한 현실에 마음이 아프다. 살인사건과 신출귀몰한 사기범들 그리고 무조건 반대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안간힘쓰는 정치권 모습을 보면 더 안쓰럽다.
늦가을 하늘이 시리도록 푸르다. 그 투명함 속에 반짝이는 까치밥은 날짐승들을 위한 단순한 까치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나눔과 배려의 삶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까치밥으로 달려 있다.